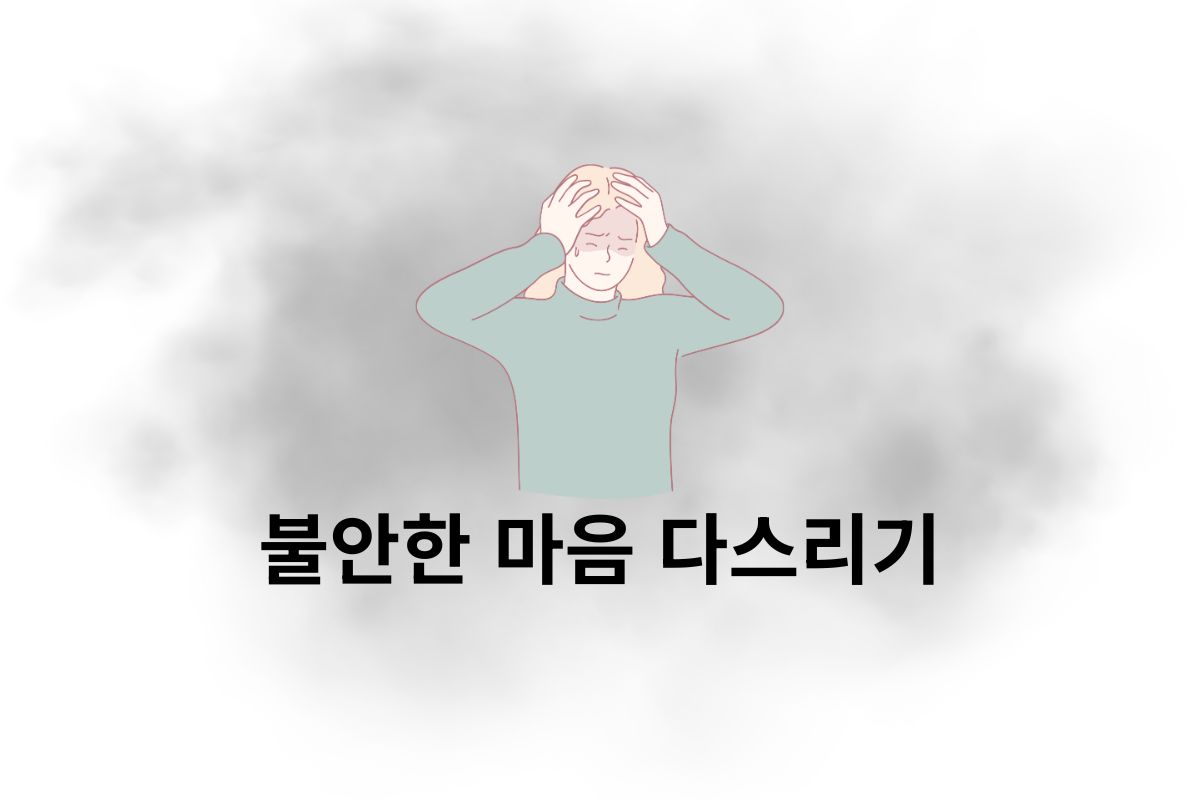매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나는 늘 — 불안한 마음 — 이라는 낯선 그림자와 함께 살았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조여 왔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마음은 늘 대비 태세였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유난히 긴장도가 높은 아이였다.
시험이 있는 날이면 배가 아프고,
누군가의 시선이 머물면 손끝이 차가워졌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렸고,
세상의 모든 감정이 내 안에서 너무 크게 울렸다.
연주자가 되었을 때도 그 불안은 여전히 내 그림자였다.
무대에 오르기 전,
심장이 요동치고 손끝이 떨렸다.
관객의 숨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대기실 한켠에서
나는 내 불안을 손으로 꼭 쥐고 있었다.
그 불안은 언제나 내 곁에 있었고,
나는 그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엄마는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다.
“괜찮아, 너는 그냥 그런 아이야.”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지금,
그 시절의 나를 다시 떠올리면 아쉬움이 남는다.
엄마는 내 불안을 이해해 주셨지만,
그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을 함께 찾아주지는 못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믿으셨다.
그리고 나는 그 믿음 속에서,
끝내 불안을 스스로 감당해야 했다.
이제 나에게도 예민한 딸이 있다.
나를 꼭 닮은 아이.
낯선 사람 앞에서 몸을 굳히고,
작은 소음에도 눈살을 찌푸린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과거의 나를 본다.
그래서 다짐했다.
이 아이에게는 ‘참는 법’이 아니라
‘다스리는 법’을 알려주어야겠다고.
불안을 숨기지 않고,
함께 마주보며 걸어가는 연습을 하고 싶었다.
그 마음이, 아마도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일 것이다.
🌿 불안을 ‘나의 일부’로 인정하기
오랫동안 나는 불안을 부정적인 감정이라 여겼다.
없애야 할 적, 견뎌야 할 괴물.
하지만 그건 잘못된 싸움이었다.
불안을 밀어낼수록 불안은 더 크게 자라났다.
불안은 나의 일부였다.
조심스럽게 살아가게 하고,
위험을 예측하게 만드는 일종의 신호등이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자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었다.
나는 불안에게 이름을 붙였다.
‘미래 걱정 대장’, ‘과거 후회 박사’.
이름을 붙이는 순간, 불안은 나와 분리되었다.
그건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잠시 찾아온 손님이 되었다.
그 손님을 억지로 쫓아내지 않고,
차 한 잔을 건네듯 맞이하는 법을 배웠다.
이건 불안과 싸우지 않고 공존하는 첫 연습이었다.
💭 불안의 스위치 찾기
불안은 이유 없이 찾아오는 것 같지만,
늘 그 뒤에는 촉발점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불안 일기’를 썼다.
불안이 몰려오는 시간, 장소, 상황을 기록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패턴이 보였다.
나의 불안은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었다.
아이의 미열, 남편의 늦은 귀가,
엄마의 짧은 한숨.
그 모든 것이 나의 경보음을 울렸다.
하지만 원인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자
막연한 공포는 현실적인 대비로 바뀌었다.
상비약을 정리하고,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두고,
가족끼리 “괜찮다”는 의미의 이모티콘 약속을 정했다.
이런 사소한 준비들이
불안의 크기를 줄여주었다.
불확실성 대신, 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행동’이 생겼기 때문이다.
🌙 불안을 잠재우는 나만의 루틴 만들기
불안은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그래서 즉시 꺼낼 수 있는 ‘마음의 매뉴얼’이 필요했다.
나에게 그건 루틴이었다.
불안이 올라올 때, 나는
따뜻한 차를 마시고,
좋아하는 클래식 한 곡을 듣는다.
그 선율이 내 심박수를 천천히 낮춘다.
복식호흡을 다섯 번 반복하고,
햇빛이 비치는 창가에 앉아 잠시 눈을 감는다.
조금 더 시간이 허락된다면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 멀리 나간다.
그 낯선 거리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면
내 생각의 크기가 줄어든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그 안에서 나는 그저 한 사람일 뿐이라는 걸 깨닫는다.
루틴은 불안의 파도 속에서
나를 고정시켜주는 닻이다.
익숙한 행동이 주는 안정감은
그 어떤 약보다 빠르게 마음을 진정시켜준다.
🌾 ‘지금 여기’로 돌아오기
불안은 늘 미래로 달려간다.
‘혹시’, ‘만약’, ‘그때’라는 단어들이
현재의 나를 집어삼킨다.
그래서 나는 의도적으로 ‘지금’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한다.
이를 ‘감각 접지(Grounding)’라 부른다.
보이는 다섯 가지를 떠올리고,
손끝으로 느껴지는 네 가지 촉감을 확인한다.
들리는 세 가지 소리, 맡을 수 있는 두 가지 향,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맛.
이 짧은 감각의 순서가
나를 머릿속의 불안에서
몸이 있는 현실로 데려온다.
그때마다 심장이 서서히 안정되고,
숨이 다시 고르게 흐른다.
🌼 마무리 —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법
불안은 여전히 내 안에 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불안은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일 뿐이다.
이제 나는 불안을 미워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그래, 너 또 왔구나. 괜찮아. 잠시 옆에 앉아 있어.”
그렇게 받아들이면 불안은 잠시 머물다 사라진다.
나는 여전히 예민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 예민함 덕분에,
세상의 온도를 조금 더 섬세하게 느낀다.
그리고 그 섬세함 속에서
조용한 평화를 배워가고 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의 불안은 결함이 아니다.
그건 단지, 세상을 조금 더 깊게 느끼는 방식일 뿐이다.
그러니 오늘 하루, 불안한 자신을 탓하지 말고
그 마음을 조용히 안아주자.
우리 모두는 충분히 괜찮은 존재다. 🌿